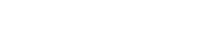책소개
저자소개
목차
오늘 밤부터 우리의 시간은 철학과 함께 흐른다!
니체, 키르케고르, 쇼펜하우어, 들뢰즈…
생각하는 ‘불안한 존재’들을 위한 철학의 농밀한 위로
밤은 생각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낮은 ‘타인’의 시선과 ‘밖’의 소리로 시끄러웠다면, 밤은 ‘자신’과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밤에는 때때로 이유 모를 불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늘 비슷한 고민들로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밤에 읽는 소심한 철학책》은 보통 사람들의 하루 끝에 가장 적합한 철학책이다. 니체가 말하는 ‘이미 도래한 미래’부터 라이프니츠의 인생 방정식,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데카르트가 의심한 ‘생각’의 실체, 들뢰즈의 노마드 철학, 베르그송의 원뿔 시간 모델까지… 책 속 그들의 철학은 우리 마음속 의문들에 대한 길을 탐색한다.
온전히 나만 남은 시간, 불안할 대로 불안해보는 시간, ‘타인’과 ‘저기’ 대신, ‘나’와 ‘여기’를 둘러보는 시간. 오늘 밤, 생각하는 ‘존재’들을 위한 철학의 농밀하고 다정한 위로를 펼쳐보자.
잠이 오지 않는 밤,
TV 끄고, 스마트폰 멀리 두고, 철학 한 페이지
어제와 다를 것 없었던 오늘, 오늘과 비슷할 내일을 앞두고 쉽사리 잠이 오지 않는다. 오늘 했던 말, 겪은 일들을 떠올리며 아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때때로 막막하다.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밤’에 만나는 이 묵직한 불면.
《밤에 읽는 소심한 철학책》은 일상의 매 순간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모른 채 지나치고 있는 흥미로운 ‘철학적 사유’를 ‘불안’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놓았다. 철학에서는 불안의 정서로부터 생각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불안하니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사 다 아는 듯 떠들어대는 철학자들도, 실상 밤으로 찾아든 불안과 고민 속에서 해답을 얻어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고민의 시간은 잠을 뺏어간 대신, 길이 남을 철학적 대명제들을 주고 간 것이다. 결국 그들도 우리처럼 밤새 소심한 존재들일 뿐이었다.
《밤에 읽는 소심한 철학책》은 우리보다 먼저 밤을 지새운 철학자들의 ‘생각’을 들춰보며 새로운 ‘생각’으로의 길을 터준다. 후회의 밤, 불안의 밤, 공허한 밤, 절망의 밤, 귀찮은 밤에 머리맡으로 찾아온 스물세 가지 철학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니체, 키르케고르, 쇼펜하우어, 들뢰즈…
일상 속 매 순간에 깃든 ‘철학’의 거의 모든 것
이 책의 저자 민이언은 ‘동양철학’이라는 봇짐을 둘러매고 거의 모든 ‘서양철학’을 둘러보고 연구했다. 그는 철학이라는 식재료를 최대한 많이 제대로 손질해 놓기 위해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쓰고 있다. 그리고 이 재료를 가지고 맛깔 나는 글을 써내는 요리의 고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속 철학적 사유들은 비록 그 시작이 거창한 이론일지는 몰라도, 그의 손을 거쳐 흥미로운 비유와 다양한 예시로 풀어져 있다.
주변의 누군가를 소심하다고 말하는 경우를 보면, 그 소심의 정도는 내 기준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기준을 ‘보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그 보편의 시선이 나에게 되돌아왔을 때, 나 자신도 그 소심함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 남이 이별했을 때는 상대방의 입장 따위 고려하지 않고 냉철한 조언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이별 앞에서는 세상 끝났다는 듯 부어라 마셔라 진상을 떨어대는 우리니까. 결국 이미 내가 걸려 있는 소심의 범주로 남의 소심함을 규정하는 것이다.
흔히 겪는 이러한 일상을 통해 우리는 ‘타자’와 ‘보편’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타자’란 나에게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 타자를 정의하는 기준도 ‘나’이기 때문이다. 나와 떨어져 있지만 결국 내 흔적을 지니고 있는 ‘나를 포함한 타인’이다. 저자는 더 쉬운 예를 하나 든다. “아빠와 오빠 말고 이 세상 모든 남자는 믿지 말라는 아빠와 오빠들이, 자신들 이외의 모든 남자들을 잠정적 악으로 규정하는 경우다.”
베르그송의 ‘원뿔 시간 모델’을 남자 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연인 관계에서 찾아내기도 한다. 남자 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치자. 여자 친구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른다. 여자 친구가 진실을 알기 전까지 여자 친구에게 남자 친구의 바람은 아직 현재화하지 않은 미래다. 이미 여자 친구에게 마음이 떠난 남자 친구로서는, 자신에게 여전히 애정을 쏟는 여자 친구는 과거에 머무는 셈이다.
이들의 시간을 베르그송의 원뿔로 가져와보면, 원뿔 안 공간은 과거이고 그 과거가 집약되어 있는 원뿔의 꼭짓점은 지금 ‘이 순간’이다. 꼭짓점 높이 이상의 허공은, 원뿔을 움직이기만 하면 꼭짓점과 닿는 지점이 모두 현재화 될 수 있는 잠재적 미래다. 따라서 원뿔의 밑면부터 꼭짓점 높이까지의 원뿔 밖 공간은 과거의 시간대에 있지만 나에게 발견되지 못한 채, 나도 모르게 과거로 흘러가버린 시간이다. 이 연인처럼 함께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누군가의 미래에 존재하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렇듯 시간은 개인적이며 순간은 미래, 과거, 현재가 혼재해 있는 접점이다.
깨지지 않고 깨치는 존재가 되기 위한 ‘생각’
‘철학의 눈’을 뜬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신은 정말 존재할까? 신이 있다면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 인간이라면 한 번쯤 품는 의문. 이에 대해 철학은 “너의 모든 순간에 모든 방식으로 신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미 나의 존재 자체가 그 절대정신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신에게 의지하려는 나약함은 도리어 나약한 신을 섬기는 신앙에 대한 불경이라는 것.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때’는 숙명의 서사대로 기다리는 순간이 아니라, 너 스스로 다가가 맞이해야 하는 순간이다. 신 앞의 기도는 ‘지켜주세요.’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낼 테니 지켜봐주세요.’가 되어야 한다. ‘너 스스로 일어나라.’ 함이다. ‘너 스스로 이루어내라.’ 함이다.”
신은 인간에게 끝없는 이야기를 허락했고, 우리가 가는 길이 곧 길이라는 이 말은 “삶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만큼이 우리의 운명이고 신의 뜻이다.”라는 사유로 이어진다.
그 어떤 책에도 개인의 인생에 대한 지침은 적혀 있지 않다. 각자의 편차로 벌어진 고민의 방위각은 스스로 알아내야 할 문제다. 누군가에게 깨지면 프라이가 되지만 스스로 깨치고 나오면 병아리로 태어나는 것처럼, 내 세계는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철학을 통해 고민의 답을 깨칠 수 있도록, 이 책은 나의 틀 밖으로 한 발 더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이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니체, 키르케고르, 쇼펜하우어, 들뢰즈…
생각하는 ‘불안한 존재’들을 위한 철학의 농밀한 위로
밤은 생각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낮은 ‘타인’의 시선과 ‘밖’의 소리로 시끄러웠다면, 밤은 ‘자신’과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밤에는 때때로 이유 모를 불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늘 비슷한 고민들로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밤에 읽는 소심한 철학책》은 보통 사람들의 하루 끝에 가장 적합한 철학책이다. 니체가 말하는 ‘이미 도래한 미래’부터 라이프니츠의 인생 방정식,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데카르트가 의심한 ‘생각’의 실체, 들뢰즈의 노마드 철학, 베르그송의 원뿔 시간 모델까지… 책 속 그들의 철학은 우리 마음속 의문들에 대한 길을 탐색한다.
온전히 나만 남은 시간, 불안할 대로 불안해보는 시간, ‘타인’과 ‘저기’ 대신, ‘나’와 ‘여기’를 둘러보는 시간. 오늘 밤, 생각하는 ‘존재’들을 위한 철학의 농밀하고 다정한 위로를 펼쳐보자.
잠이 오지 않는 밤,
TV 끄고, 스마트폰 멀리 두고, 철학 한 페이지
어제와 다를 것 없었던 오늘, 오늘과 비슷할 내일을 앞두고 쉽사리 잠이 오지 않는다. 오늘 했던 말, 겪은 일들을 떠올리며 아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때때로 막막하다.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밤’에 만나는 이 묵직한 불면.
《밤에 읽는 소심한 철학책》은 일상의 매 순간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모른 채 지나치고 있는 흥미로운 ‘철학적 사유’를 ‘불안’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놓았다. 철학에서는 불안의 정서로부터 생각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불안하니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사 다 아는 듯 떠들어대는 철학자들도, 실상 밤으로 찾아든 불안과 고민 속에서 해답을 얻어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고민의 시간은 잠을 뺏어간 대신, 길이 남을 철학적 대명제들을 주고 간 것이다. 결국 그들도 우리처럼 밤새 소심한 존재들일 뿐이었다.
《밤에 읽는 소심한 철학책》은 우리보다 먼저 밤을 지새운 철학자들의 ‘생각’을 들춰보며 새로운 ‘생각’으로의 길을 터준다. 후회의 밤, 불안의 밤, 공허한 밤, 절망의 밤, 귀찮은 밤에 머리맡으로 찾아온 스물세 가지 철학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니체, 키르케고르, 쇼펜하우어, 들뢰즈…
일상 속 매 순간에 깃든 ‘철학’의 거의 모든 것
이 책의 저자 민이언은 ‘동양철학’이라는 봇짐을 둘러매고 거의 모든 ‘서양철학’을 둘러보고 연구했다. 그는 철학이라는 식재료를 최대한 많이 제대로 손질해 놓기 위해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쓰고 있다. 그리고 이 재료를 가지고 맛깔 나는 글을 써내는 요리의 고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속 철학적 사유들은 비록 그 시작이 거창한 이론일지는 몰라도, 그의 손을 거쳐 흥미로운 비유와 다양한 예시로 풀어져 있다.
주변의 누군가를 소심하다고 말하는 경우를 보면, 그 소심의 정도는 내 기준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기준을 ‘보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그 보편의 시선이 나에게 되돌아왔을 때, 나 자신도 그 소심함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 남이 이별했을 때는 상대방의 입장 따위 고려하지 않고 냉철한 조언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이별 앞에서는 세상 끝났다는 듯 부어라 마셔라 진상을 떨어대는 우리니까. 결국 이미 내가 걸려 있는 소심의 범주로 남의 소심함을 규정하는 것이다.
흔히 겪는 이러한 일상을 통해 우리는 ‘타자’와 ‘보편’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타자’란 나에게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 타자를 정의하는 기준도 ‘나’이기 때문이다. 나와 떨어져 있지만 결국 내 흔적을 지니고 있는 ‘나를 포함한 타인’이다. 저자는 더 쉬운 예를 하나 든다. “아빠와 오빠 말고 이 세상 모든 남자는 믿지 말라는 아빠와 오빠들이, 자신들 이외의 모든 남자들을 잠정적 악으로 규정하는 경우다.”
베르그송의 ‘원뿔 시간 모델’을 남자 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연인 관계에서 찾아내기도 한다. 남자 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치자. 여자 친구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른다. 여자 친구가 진실을 알기 전까지 여자 친구에게 남자 친구의 바람은 아직 현재화하지 않은 미래다. 이미 여자 친구에게 마음이 떠난 남자 친구로서는, 자신에게 여전히 애정을 쏟는 여자 친구는 과거에 머무는 셈이다.
이들의 시간을 베르그송의 원뿔로 가져와보면, 원뿔 안 공간은 과거이고 그 과거가 집약되어 있는 원뿔의 꼭짓점은 지금 ‘이 순간’이다. 꼭짓점 높이 이상의 허공은, 원뿔을 움직이기만 하면 꼭짓점과 닿는 지점이 모두 현재화 될 수 있는 잠재적 미래다. 따라서 원뿔의 밑면부터 꼭짓점 높이까지의 원뿔 밖 공간은 과거의 시간대에 있지만 나에게 발견되지 못한 채, 나도 모르게 과거로 흘러가버린 시간이다. 이 연인처럼 함께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누군가의 미래에 존재하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렇듯 시간은 개인적이며 순간은 미래, 과거, 현재가 혼재해 있는 접점이다.
깨지지 않고 깨치는 존재가 되기 위한 ‘생각’
‘철학의 눈’을 뜬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신은 정말 존재할까? 신이 있다면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 인간이라면 한 번쯤 품는 의문. 이에 대해 철학은 “너의 모든 순간에 모든 방식으로 신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미 나의 존재 자체가 그 절대정신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신에게 의지하려는 나약함은 도리어 나약한 신을 섬기는 신앙에 대한 불경이라는 것.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때’는 숙명의 서사대로 기다리는 순간이 아니라, 너 스스로 다가가 맞이해야 하는 순간이다. 신 앞의 기도는 ‘지켜주세요.’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낼 테니 지켜봐주세요.’가 되어야 한다. ‘너 스스로 일어나라.’ 함이다. ‘너 스스로 이루어내라.’ 함이다.”
신은 인간에게 끝없는 이야기를 허락했고, 우리가 가는 길이 곧 길이라는 이 말은 “삶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만큼이 우리의 운명이고 신의 뜻이다.”라는 사유로 이어진다.
그 어떤 책에도 개인의 인생에 대한 지침은 적혀 있지 않다. 각자의 편차로 벌어진 고민의 방위각은 스스로 알아내야 할 문제다. 누군가에게 깨지면 프라이가 되지만 스스로 깨치고 나오면 병아리로 태어나는 것처럼, 내 세계는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철학을 통해 고민의 답을 깨칠 수 있도록, 이 책은 나의 틀 밖으로 한 발 더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이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